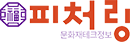▲ 산불 이후 전국 각지에서 헌옷이 보내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세탁도 하지 않은 거의 쓰레기같은 옷을 보내 분류에 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산불 이후 전국 각지에서 헌옷이 보내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세탁도 하지 않은 거의 쓰레기같은 옷을 보내 분류에 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를 휩쓴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지 2주가 흘렀다. 화마는 하루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은 복구 작업으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구호물품과 자원봉사 지원 등 온정의 손길도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2만여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신청,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한 게스트하우스도 있다. 관광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봉사활동을 하고 간 사람들도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5일간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한 황모(29·여)씨와 이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한 강원도 속초시 소호게스트하우스 주인 이상혁(33)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SNS를 통해서 강원 산불 피해자들이 입을 옷이 없으니 헌옷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삽시간에 퍼지면서부터 시작된 일말의 소동이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서울시 방화동에서 속초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간 황씨는 지난 11~12일, 14~16일에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전국에서 온 구호물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전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황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강원도 산불이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되면서 자원봉사를 결심하게 됐다"며 "차비만 10만원이 들었다. 그래도 숙소가 제공돼 5일 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이런 일에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차비 걱정만 없으면 또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재민들에게 온 손편지를 보면 아직 한국은 살만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또, 작업을 하다보면 옷을 몇벌은 버리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위한 작업복을 받았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편지를 읽을 때마다 뭉클했다고 말했다.
편지를 보고 자원봉사자들과 다함께 운 사연도 전했다. 황씨는 "돌아가신 아내 분 이름을 써서 구호 물품을 보내온 분이 있다"며 "편지에 '좋은 곳에 너의 이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쓰여 있었다. 다함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만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씨는 일주일 가까이 분류 작업을 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많지만 황당한 일도 적지 않았다며 자신의 '처참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황씨는 "새옷같은 헌옷을 보내주는 분들도 있지만 먹다 남은 약, 먹다 남은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약 등 쓰레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 번은 헌옷을 정리하다 장농 썩은 냄새, 빨지 않은 속옷 냄새를 맡고 구토를 할 뻔했다"며 "정리하다 집에 가면 미세먼지가 있던 날처럼 눈이 따가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일 황당했던 물건은 빨지 않은 속옷과 약을 다 먹고 두 알 남은 상태로 보낸 경우였다. 충전기인데 전선 등이 다 뜯어진 채 온 경우도 있었다. 그는 "빨지 않은 속옷, 보풀이 심한 옷, 얼룩진 옷 등 입을 수 없는 쓰레기를 보내면 화가 난다"며 "20~30명이 헌옷 분류에 매달려야 한다. 안 그래도 손이 부족한데 쓰레기를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리하면 10박스에 1박스는 이런 것들"이라고 전했다.
쓰레기급에 속하거나 집안의 처치곤란인 물품들을 그냥 보내버린 경우였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의식이 이렇게 일부는 후진적이다.
한편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원하는 경우 먼저 전화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게 좋다고 한다. 너무 많은 자원봉사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자원봉사 인원을 한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최수정 기자 soojung@featuring.co.kr